과학과 직감이 공존하는 의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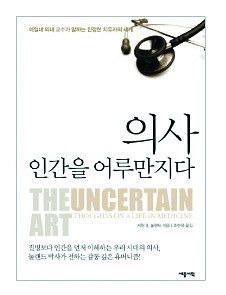
한평생 외과의사로 헌신하며, 많은 불확실한 상황들 앞에서 얻은 깨달음을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살아온 저자가 의사의 선의(善意)가 가진 치유력에 대해 들려준다. 단지 질병뿐 아니라 사람 전체를 보살피는 데 헌신한 의사들의 이야기, 환자들에 대한 인본주의적 관심을 표명했던 인물들의 이야기를 묶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히포크라테스의 ‘첫번째 아포리즘’에 나오는 이 문장에서 예술은 사실 의술이었다. 히포크라테스는 이 문장에 이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기회는 순식간에 지나가고 경험은 오류가 많으며 판단은 어렵다. 의사는 그 자신이 올바른 일을 할 준비뿐만 아니라 환자와 간병인, 외부 여건을 협력하게 만들 준비도 하고 있어야 한다.” 그는 의사를 과학과 직감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장담할 수 없는 판단을 내리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의사는 천직에 겸손해야 한다
의사는 의술의 불확실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자신의 천직에 대하여 겸손해야 한다는 경계의 뜻을 담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의 이런 생각은 학생들을 잘 가르치거나 환자를 잘 치료하는 의사보다는 정부나 재단으로부터 교부금을 더 많이 따내는 의사가 더 대우 받고, ‘환자를 보살피는 법을 가르친다’는 교육의 목표를 잊은 의과대학의 현실을 꼬집는다.
그리고 저자는 의학의 과학화가 확대되면서 의학의 비인간화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고 말한다. 의료전문직에 종사하는 우리는 ‘의사 기술자’라는 경멸적 표현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자기반성을 덧붙인다.
예컨대 의대생 교육의 주된 목표는 “환자를 보살피는 법을 가르친다.”는 것이어야 하는데, 오늘날 미국의 의과대학은 이를 잊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그 대책으로 저자는 인문학을 교육하고 인본주의적 교양을 쌓게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의대생에게 문학, 역사, 철학 그리고 미국이 아닌 다른 사회의 역사와 믿음을 가르쳐야 한다고 역설한다. “진정한 의사는 무엇보다도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인물이 되어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의사는 환자를 돌보는 사람이다
저자는 의학사를 비롯해 의사 생활 40년 동안의 경험, 인간 복제와 유전자 치료에 대한 윤리적 논란 등을 종횡무진 다루며 한 가지 깨달음을 이끌어 낸다. 의사는 결코 의료기술로만 환자를 고치는 것은 아니고 환자의 자연 치유력을 극대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아픈 몸과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
의사는 ‘환자를 돌보는 사람’이라는 기본, 즉 히포크라테스의 아포리즘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눌랜드 박사는 ‘의사, 인간을 어루만지다’를 통해 의학사를 짚어보고, 최근에 일어난 과학의 눈부신 발전에 대해 고찰하고, 본인의 일상적인 삶에서 일어난 일들을 반추하며 좀 더 나은 판단자가 되기 위해 의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 답하고 있다.
또한 진정한 치유자가 되기 위해 의사는 어떠한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해 총체적으로 고찰한다. 이 책에서는 한 사람의 의사로서 사람들을 보다 행복한 삶으로 이끌기 위해 자신이 할 일에 관해 고뇌와 성찰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외과의사답게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현실을 묘사하면서도, 약해지기 쉬운 존재인 인간에 대한 깊은 연민과 애정을 놓지 않는 그의 마음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